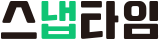경제 일반
2019년 5월 15일 - 오전 6:00
김영란법 시행 3년...스승의 날이 부담스러워요

“스승의 날에 담임을 맡은 반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직접 쓴 롤링페이퍼와 함께 ‘몽쉘’로 만든 케이크를 선물해줬습니다. 케이크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고맙다는 말도 했지만 케이크는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줬죠.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솔직히 이렇게해서라도 스승의 날을 기념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스승의 날에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에게서 케이크를 받았지만 같이 먹지 못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했다. 바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정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시행은 1년에 한 번 교사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날인 스승의 날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예전처럼 카네이션이나 선물로 교사에게 감사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엔 스승의 날을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피하지 못해 스트레스 받는 교사들만이 남아 있었다.
피하거나 견디거나, 골칫거리로 전락한 스승의 날
충청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B씨는 3년째 스승의 날을 학교 밖에서 맞이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 자체적으로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마다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단체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가기 때문이다. B씨는 ‘차라리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으면 별다른 행사 없이 스승의 날을 넘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B씨의 학교처럼 스승의 날에 맞춰서 소풍이나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또 스승의 날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하고 휴교하는 학교들도 생기고 있다. 이는 스승의 날에 학교를 비움으로써 김영란법에 저촉될 만한 행위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려는 학교 측의 노력이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휴교를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스승의 날은 교사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다. 교사는 스승의 날 전부터 가정통신문으로 스승의 날 선물을 일절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그럼에도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은 음료든 꽃이든 상관없이 거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물론 선물을 가져온 학생이나 전달을 부탁한 부모 모두가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C씨는 “선물을 가져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일이 거절하는 게 큰 스트레스다. 가끔씩 막무가내로 선물을 주고 가는 학부모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학생편으로 선물을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는 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지 하나, 사탕 하나, 꽃 하나 못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스승의 날에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인 만큼 그 날에 특별히 조퇴를 하거나 문화연수를 나가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떠나 있는 교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학교에 있으면 신경 쓸 일도 많고 기분 나빠지는 일만 생기니 교사가 직접 학교를 벗어나는 것이다.

존중 받지 못하는 교사에게 '스승의 날'은 필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스승의 날을 아예 없애달라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매년 올라오는 스승의 날 폐지 국민 청원이 대표적이다. 학생,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날로 늘어가고 언론은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말로 교사를 조롱하며, 사회는 여전히 교사를 ‘촌지나 받는 무능한 교사’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스승의 날은 허황된 기념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이라는 게 없다시피 한 교육 현실에 대한 성토는 스승의 날 폐지를 외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 모 초등학교 교사 D씨는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기는커녕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도 않는 게 현실이다. 인격적인 존중도 제대로 못 받는데 스승의 날은 무슨 스승의 날인가.”라며 “의미 없는 기념일 대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말뿐인 ‘스승의 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의 인권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