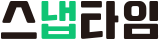경제 일반
2020년 2월 24일 - 오전 12:30
1평 남짓한 ‘잠만 자는 방’에 내몰린 청년들

최근 영화 ‘기생충’의 흥행으로 영화의 핵심 배경이었던 반지하가 화두에 올랐다. 땅에 묻힌 좁은 창문으로 인해 해가 거의 들지 않아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는 극 중 빈곤한 계층을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을 때가 있다. 대학가에는 반지하조차 들어가기 힘든 학생들이 사는 열악한 공간이 있다. ‘잠만 자는 방’이다.

‘잠만 자는 방’이란?
‘잠만 자는 방’은 신촌, 회기 등 대학교가 밀집한 원룸촌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주거 환경이다. 책상과 침대를 넣으면 공간이 거의 남지 않는 좁은 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방 내부에 조리 시설이 없어 요리가 불가능하다. 세탁기 역시 전 세대가 동시에 사용하는 한 두 대만이 비치되어있다. 공간이 좁아 방 내부에서 잠을 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잠만 자는 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셈이다.
대학교 근처 원룸촌의 전봇대에는 “잠만 자는 방 있습니다”라는 홍보 용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잠만 자는 방’은 기존에 대학가 하숙집을 운영했던 곳이 많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사 제공이 어려워진 탓이다.
좁은 하숙방을 빌려주는 대신 기존에 제공하던 세탁, 식사 등 생활 서비스를 제외한다. 그 덕에 보증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아, 기숙사 입사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룸 입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선택한다.

좁은 면적 탓 일상생활에 제약 커
임윤민(25,가명)씨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1년간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의 ‘잠만 자는 방’에 거주했다. 통학 시간이 왕복 3시간 넘게 소요됐지만 호적상 거주지가 서울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주를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의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잠만 자는 방’이었다. 내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방에서는 용도에 맞게 잠만 자면 괜찮으리라 생각한 결과였다.
임씨는 곧 자신의 생각이 오판이었음을 깨달았다. 입주한 ‘잠만 자는 방’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다. 두 팔을 벌리면 방의 양 벽이 손에 닿았다. 높이 역시 바로 서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다.
화장실에서는 샤워부스 2개를 13명이 함께 사용했다. 출근과 등교가 서로 겹치는 아침이면 샤워부스를 기다리다 지각하기 일쑤였다. 다음 날부터는 샤워부스를 선점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다. 방음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었다. 옆 방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임 씨의 방에 전달됐다.
임씨는 “자신과 같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다”며 “좀 더 많은 대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잠만 자는 방’ 부추긴 주거 복지 사각지대
‘잠만 자는 방’은 청년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낳은 기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정책으로는 월세 부담을 덜고자 하는 저수익 대학생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턱없이 적어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다.
실제로 2018년 대학생·청년용으로 공급한 서울 공릉 행복주택의 경우 2가구 모집에 1091명이 지원해 54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위해선 평균 4000만~80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평범한 대학생이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2017년 행복주택 최초 당첨자의 계약률이 76%에 그친 이유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은 특성상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수혜 대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청년들이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내 집 마련 혹은 스스로 월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조금 지원 등 일시적 효과에 그쳐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각 정당은 4·15 총선을 대비해 청년 주거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중 수요가 집중된 용산 등 서울 역세권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는 5만호를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정의당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 가구를 위해 주거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 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이 외에도 대도시 역세권에 청년 유스팰리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당에서 총선용으로 내놓은 청년 주거 복지 정책들은 근본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청년들은 일시적 거주 지원이 아닌, 꾸준히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며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주거 정책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정의당의 주거 수당 공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교수는 “주거 수당은 당장 월세를 내기 힘든 청년에게는 반가운 공약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월세를 올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자 쪽방촌의 월세가 올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청년에게 지원하는 주거 수당을 결국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장 등의 소득증대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거주비를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