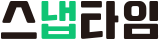경제 일반
2019년 2월 20일 - 오전 12:10
등록금 내고도 수강신청 못하는 대학생들의 고민

서울 소재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 모(22)씨는 며칠 전 수강신청 경쟁에 실패해 휴학까지 고민 중이다. 이번 학기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전공 수업을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수님께 선처를 구하는 메일도 보내봤지만 이미 인원이 많아서 어렵다는 답장을 받았다.
이씨는 "수업이 한 학기씩 밀려 추가학기를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며 "돈을 더 내고 추가학기를 듣는 것보단 차라리 휴학하고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때 다시 도전하는 게 낫지 않겠나. 내 돈 내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도 못 듣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 대학가에선 등록금을 내고도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학사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생 600여명... 학교 측 문제로 "꼭 듣고 싶은 수업, 듣지 못해"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18년 2학기 수강신청을 마친 대학생 37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강신청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기 수강신청에 실패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29.5%(11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이 열띤 수강신청 경쟁에 밀려난 셈이다.
수강 신청 실패의 원인(복수응답)은 ‘인기수업에 수강인원이 몰려서’가 52.8%(1,964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업 수강 정원 자체가 적어서’가 39.6%(1,482명)로 뒤를 이었다. 이 학생들의 절반 이상(54.3%·601명)이 수강신청 실패로 ‘꼭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한다’고도 응답했다.

개강 전 수강신청을 앞둔 대학생 은정희(24·여) 씨는 “1학년 때부터 꼭 듣고 싶었던 강의가 있었는데 인기강의라서 매번 수강신청에 실패했다"며 "학교 측에 수업 증강도 요청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싼 등록금까지 줬는데 수업을 듣지 못하는 건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대학생들의 불편함은 이번 학기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이른바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은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 강의 시간을 주당 6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특별한 경우만 최대 9시간까지 가능하다. 방학 중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립대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강사를 줄이거나 수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실제로 강사제도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에 따르면 고려대는 올해 1학기에 지난해 기준 200여 강좌를 줄였다. 연세대는 선택 교양 과목을 60%로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는 강의를 사고파는 행위까지 등장했다. 모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졸업을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 혹은 듣고 싶은 수업의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해당 수업 신청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금전적 사례를 할테니 수업을 팔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수십 페이지에 달할 정도다.
실제로 다른 학생에게 금전적 사례를 하고 수업 수강을 양도 받은 김모(26·여) 씨는 “수업료로 등록금을 내는데 수업을 얻기 위해 또 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어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대학생들의 ‘권리 의식’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발달하면서 언급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공부하겠다고 대학에 온 만큼 좋은 강의를 듣고자 하는 기대나 욕구는 당연한 사안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면 개설해주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실적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강의 인원을 늘리게 되면 강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분반을 신설하면 한 교수당 정해진 강의시수에 따라 다른 강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인 학생과 행정 담당인 대학 본부 그리고 교수 세 주체 간 타협점이나 합리적인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구조적, 제도적, 인력적 한계가 존재하는 게 크다”고 덧붙였다./스냅타임
[전이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