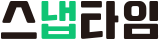경제 일반
2019년 5월 18일 - 오전 12:21
[갑자기 배낭여행] 고생샷? 인생샷! '팬 마운틴' 정복기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샷’을 찍고 싶어 한다. 분위기 있는 곳, 나만 보기 아까운 곳,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곳에서 찍은 인생샷은 개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라가서 수많은 지인들의 ‘좋아요’를 받는다. 또 누군가는 그 인생샷을 보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개인적으로 인생샷 하면 타지키스탄(Tajikistan)의 ’팬 마운틴(Fann Mountains)'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꿈에서나 나올 법한 에메랄드빛 호수와 설산의 풍경, 발목을 붙잡는 산골 호수의 푸르고 투명한 모습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은 말 그대로 인생샷으로 남았다.
그런데 팬 마운틴에서의 인생샷은 사실 ‘고생샷’이었다. 남의 말만 듣고 별 준비 없이 불쑥 찾아간 팬 마운틴에서는 한 달 치 고생을 압축해서 경험했다. 거기서 좌충우돌 하면서 만났던 보석 같은 장소의 사진들이 지금의 인생샷으로 남은 것이다. 그때의 고생 없이 지금의 인생샷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을까. 고생 없는 인생은 없다는 가르침을 인생샷에서 배우면서 팬 마운틴에서의 2박3일을 추억해본다.
세상 착한 아저씨 샤잇과 인생 호수 쿨리칼론
팬 마운틴으로 떠난 계기는 사실 단순했다. '파미르 하이웨이(Pamir Highway)'에서 히치하이킹 하면서 만난 이스라엘인 여행자 '노아(Noa)'와 '랜(Ran)'이 자신들의 친구가 그곳으로 1주일 정도 트레킹을 떠났다면서 생각 있으면 한 번 가보라고 추천했다. 마침 파미르의 종착지인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Dushanbe)'에 도착해서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싶어 지체 없이 팬 마운틴의 시작점이 있는 타지키스탄 북서부의 도시 ‘판자켄트(Panjakent)'로 합승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다. 판자켄트에서 히치하이킹을 통해 팬 마운틴 트레킹 시작점 중 하나인 '아르투쉬(Artuch)'로 오긴 했는데 가이드북에 나온 숙소들이 모두 폐쇄돼 있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트레킹 시즌이 끝나니까 문을 열지 않은 것 같았다. 날이 빠르게 어두워지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며칠 간의 트레킹을 대비해서 가져온 캠핑 텐트가 가방에 있었다.
착잡한 마음으로 텐트를 칠 만한 자리를 찾고 있는데 인기척을 들었는지 작은 건물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러더니 손에 들려 있는 텐트를 보고는 ‘숙소는 열지 않는다’, ‘내 집으로 들어와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날이 빠르게 저물고 있어서 별말 없이 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자신을 ‘샤잇’이라고 소개한 남자의 집은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다. 그는 석유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에서 직접 차를 따라주고, 빵과 밥까지 대접해줬다. 음식을 먹으며 샤잇에게 팬 마운틴을 가로질러 ‘이스칸더쿨 호수(Iskanderkul Lake)'로 간다고 했더니 거기로 넘어가는 해발 4000m의 고갯길이 눈과 얼음으로 막혀서 갈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원래 가려던 길 대신 아르투쉬 위쪽에 있는 ’쿨리칼론 호수(Kulikalon Lakes)'를 거쳐 ’알라우딘 호수(Alaudin Lakes)‘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기로 했다. 샤잇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생고생하면서 그 고개를 어떻게든 오르려고 애썼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하고 그의 집에서 따뜻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샤잇이 준비한 레몬차와 빵으로 식사를 마친 후 샤잇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쿨리칼론 호수로 올라갔다. 애초에 목표로 했던 이스칸더쿨 호수를 못 보게 돼서 김도 상당히 빠지고 쿨리칼론 호수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었다. 거기에 호수로 가는 길도 계속 오르막이어서 딴생각할 틈도 없이 고개를 넘고 쉬기를 반복했다.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그 전과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긴 했지만 몸은 조금씩 지쳐갔다. 몸이 힘드니 ‘고작 호수 하나 보려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불평도 생겨났다. 그렇게 투덜대며 몇 시간을 오르막을 따라 걷다가 정오가 됐을 때쯤, 뾰족한 산봉우리들에 둘러싸인 꽤 넓은 지역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쿨리칼론 호수가 있었다.

쿨리칼론 호수를 처음 본 소감은 ‘이게 말이 돼?’였다. 팬마운틴 최고봉인 ‘침타르가 봉우리(Chimtarga Peak)’에서 녹아내린 물이 모여서 만든 에메랄드 빛 호수 뒤로 눈 덮인 산들이 병풍처럼 서서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이런 산골짜기에서 만날 거라곤 솔직히 상상도 못했다. 오면서 '어디 얼마나 멋진 호수가 나오나 보자'하는 독한 맘을 먹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나타난 눈부시게 아름다운 호수의 모습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배낭을 내팽개친 채 카메라를 들고 호수의 모습을 담는 동안 이곳에 오느라 오전 내내 땀 흘린 고생이 거짓말처럼 잊혔다.
고생 끝에 인생샷이 찾아온다, 알라우딘 호수
그렇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 날의 목적지인 알라우딘 호수로 가기 위해 해발 3860m의 알라우딘 패스를 넘는 일이 남아 있었다. 쿨리칼론 호수가 해발 2800m에 위치했으니 약 1000m의 고도를 올라가야 했다. 때마침 알라우딘 패스에서 다른 여행자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는 패스의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어서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아르투쉬로 내려갈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까웠고 무엇보다 왔던 길보단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은 생각에 그대로 패스를 향해 올라갔다.
처음 패스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정상은 별로 안 멀어 보이고 눈 쌓인 부분도 일부라서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꽤 큰 착각이었다. 분명 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만 같았던 정상은 아무리 걸어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정상 500m 전부터 나타난 하얀 눈은 정상까지의 길을 모두 지워버렸다. 게다가 생각보다 꽤 많이 쌓인 눈에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기 일쑤였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곳도 있었다. 운동화는 금새 다 젖었고 바지도 안팎이 모두 눈범벅이 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을 맛이었다. 다시 돌아서 내려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서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게 멀었고, 계속 올라가자니 당최 정상까지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할지 감이 안 잡혔다. 눈 딱 감고 '100걸음만 더', '100걸음만 더' 하면서 걷고 헥헥대면서 쉬고를 4~5번 정도 반복하고 나니 점차 경사가 완만해지더니 더 이상의 오르막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고, 대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알라우딘 호수가 내려다보였다.

알라우딘 패스를 겨우 넘어 알라우딘 호수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주위가 어둑어둑했다. 서둘러서 호숫가에 텐트를 치고 미리 챙겨온 빵으로 급하게 배를 채운 후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피곤함에 잠이 좀 드는가 싶더니 새벽 2~3시쯤 추위에 눈이 번쩍 떠졌다. 분명 방한 내복부터 두꺼운 패딩까지 껴입고 침낭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어느새 온몸에서 한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다시 잠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상상 이상의 추위에 선잠에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날이 조금 밝아 있었다. 시간은 오전 6시34분. 아무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텐트 밖에서 목동의 휘파람 소리와 양, 염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가만히 누워서 추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에 잽싸게 일어나서 텐트를 정리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뒤 바로 하산을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봤자 추울 뿐이니 걸어서 얼른 몸에 열을 내려는 선택이었다. 알라우딘 호수도 제대로 못 보고 부지런히 걸어 내려가는 와중에 산골짜기에 해가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가는 길 옆을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햇빛이 비치니 물 빛깔이 환상적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사진을 찍었겠지만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은 구만리고,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넣었다 하는 게 꽤나 힘든 일이라서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가기로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8666" align="aligncenter" width="700"]

그렇게 내려가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른 풍경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청록색의 물이 햇살에 반짝이는데 그 위로 설산의 풍경이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번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결국 한숨을 쉬면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이런 곳에서 인생샷 건지는 게 여기에 온 목적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힘들다고 투덜대는 마음을 달랬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런 멋진 풍경이 눈앞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멈춰서 사진을 찍을지 말지 고민하느라 꽤나 애를 먹었다. 물론 대부분 풍경에 혹해서 사진을 찍은 건 비밀이다.
그렇게 멋진 풍경과의 실랑이(?)로 시작한 하루는 발이 부르트도록 24km를 내리 걸은 뒤 두 번의 히치하이킹을 성공함으로써 결국은 산 아래에서 끝이 났다. 이로써 인생샷은 조금, 고생은 가득 남긴 2박3일 간의 팬 마운틴 일정은 비로소 막을 내렸다.
돌이켜보면 팬 마운틴은 두 번 다시 경험 못할 고생으로 가득 찬 곳이 분명하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상대로 흘러간 일이 하나도 없었고, 하산 후에 숙소로 돌아가서 피로에 취해 열두 시간 이상을 잤을 만큼 피곤한 일정이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여행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어떤 여행이든 예상치 못한 고생을 잔뜩 하기 마련이었는데, 결국은 다시 여행을 가게 된다. 왤까. 그건 아마도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여행지에서 나를 기다릴 어떤 사람,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인생사진’을 만나고 싶은 욕심.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