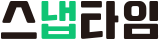경제 일반
2018년 9월 28일 - 오전 8:00
'양심과 주머니 사정 사이'…대학가 불법 제본 '여전'


개강 후 첫 수업이 끝나자마자 대학생 이모(23)씨는 제본한 전공서적을 구하기 위해 학교 근처 제본소로 향했다. 전공서적 값을 듣고 정상적으로 책을 사기에는 비싸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학기 필요한 교재는 두 권. 모두 합쳐 7만4000원이었다. 고향을 떠나 자취하는 이씨에게는 7만원을 훌쩍 넘는 교재비는 부담이다. 제본소에서 판매하는 전공서적은 권당 5000원. 카드로 결제하면 10% 수수료가 붙고 현금으로 하면 제값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씨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고 전공서적을 구해보려 했지만 구할 수 없었다”며 “찜찜하지만 교재가 너무 비싸 제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씨가 찾은 제본소는 새 학기를 맞아 북새통을 이뤘다. 학과마다 이런 불법 제본 주문이 물밀듯 밀려들다 보니 빨라야 일주일 후에나 제본한 책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대학가 출판 불법 복제물 특별 단속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대학가에는 불법 교재제본이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450개 대학 중 과거 불법 교재복제가 많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벌인 결과 147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종이책(1407점)과 PDF 파일(8109점) 등을 포함해 불법복제물 9516점을 압수했다. 정가로 2억7000만원어치다.
학생이나 제본소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법 제본은 크게 줄지 않은 모습이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364명을 대상으로 ‘전공서적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한 학기에 전공서적 6.4권을 구매하며 평균 9만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얄팍한 주머니 사정상 학생들은 제본을 선택하고 제본소도 돈벌이 수단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고 서적·도서관 책 대여 ‘하늘의 별 따기’
이씨는 “전공서적을 중고 서점 등에서 구할 수 있을까 싶어 돌아봤지만 아예 찾을 수 없는 데다 학교 근처 중고 책방에 전공서적이라도 나오면 게눈 감추듯 사라진다”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제본하려 해도 학기가 끝날 때까지 대출 버튼이라도 눌러보면 행운”이라고 말했다.
도서관에 전공 서적이 있지만 새 학기가 시작과 동시에 수십 명이 4~5권의 책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통에 대여에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대가 바뀌어도 교재 제본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책을 펴서 복사했다면 PDF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기기가 늘어난 요즘은 각종 복사실을 통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아예 '책 스캔'을 해 태블릿 PC등에 담고 다니기도 한다.
대학생 김모(22)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복사실에 특정 PDF 파일의 인쇄를 주문하면 정가보다 훨씬 싸게 책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이 많다”며 “종종 해외 서적의 PDF 파일을 구할 수 있는 주소를 첨부한 게시물도 있다”고 언급했다.
'교재 무용론'도 한 몫
‘교재 무용론’도 제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비싼 돈을 주고 전공서적을 샀지만 수업에서는 교재의 일부 내용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전공서적으로 시험도 보고 강의도 진행하지만 교수가 직접 작성해온 PPT나 학생들의 발표 수업이 학기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전공서적은 일반적으로 교수가 시험 전 일러주는 참고용으로 전락해 굳이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불법복사와 제본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한 대학가의 자정 운동도 일고 있다. 더는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다.
성균관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윤모(27)씨는 “최근 교수와 졸업생에게 전공 서적을 기부받아 정가의 10%만 받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학가 내 불법 제본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저자인 교수가 저작권을 무료로 기부해 교재를 보급하는 ‘빅북(Big Book) 운동’도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